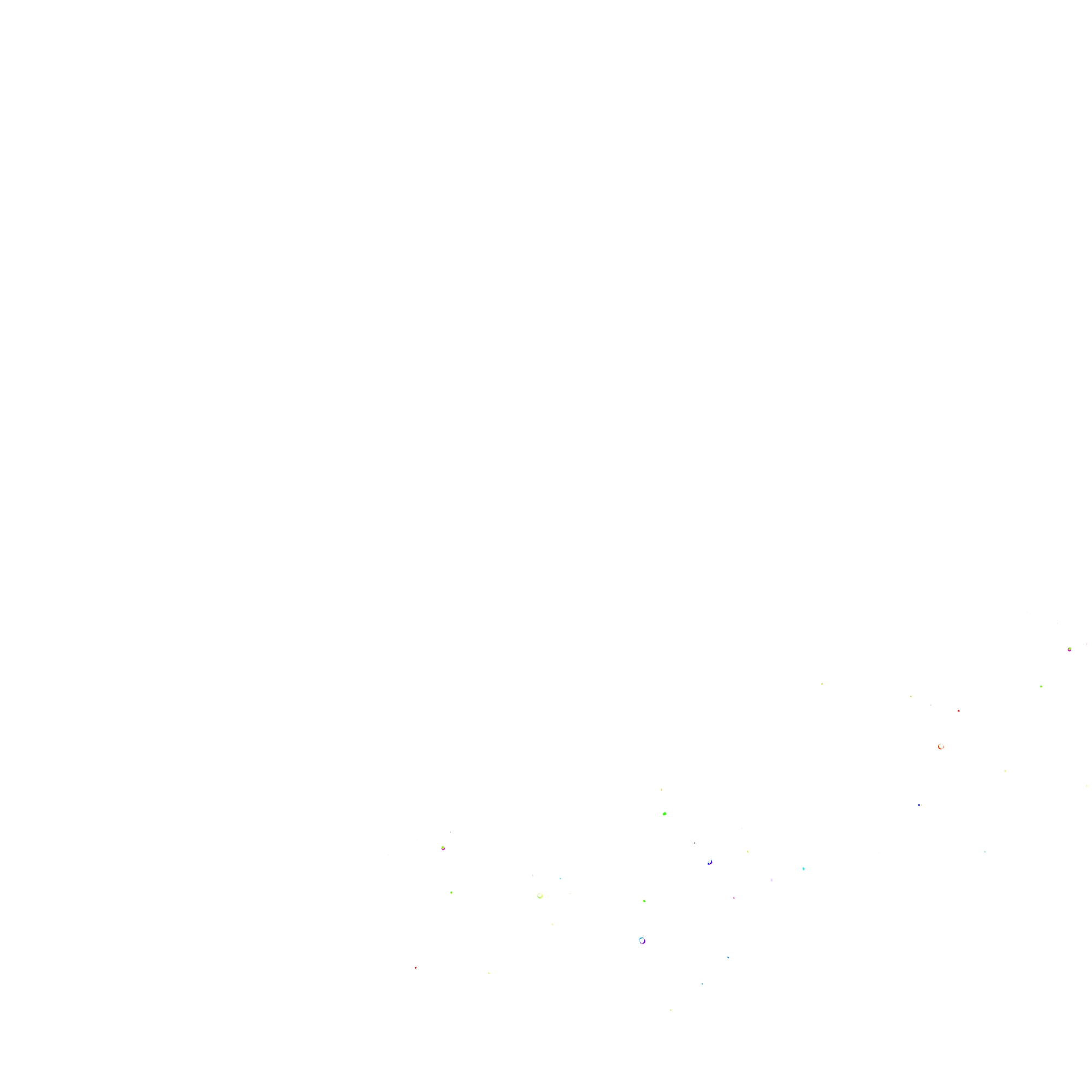히비스커스
누군가의 손에 아홉 해를 길러지면, 그를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것은 존재했다. 그가 말해주지 않는 건 대체로 알 수 없는 일들에 속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청무 밭을 지나쳐 날아온 흰 나비처럼 제 품에 기대어 왔을 때라든지, 저주받았던 츠미키의 앞에서 침묵하던 그 뒷모습이라든지, 혹은……
“너…… 누구야?”
자신을 데리러 왔던, 열아홉의 고죠 사토루의 속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랬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해서, 그가 말해주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알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집 메구미는 이만큼 쬐깐한 앤데…… 너, 메구미랑 똑같은 주력을 갖고 있네?”
“……후시구로, 메구미입니다.”
“주령?”
“사람입니다.”
“주저사?”
“주술사인데요.”
“흐응.”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후시구로는 가만히 알이 새까만 선글라스를 아래로 내려 자신을 쳐다보는 얼굴을 보았다. 스물여덟의 고죠 사토루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정돈되지 않은 날 것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 고죠 사토루가 보였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정확히는,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었다. 흰 머리카락, 검은 선글라스, 자신과 조금 다른 디자인이지만 같은 재질의 도쿄주술고전 교복까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어쩌다 보니까요.”
“우리 집 쪼끄만 애가 이렇게 자란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
“저도 눈앞의 당신이 스물여덟에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긴 하네요.”
“그 건방진 말투는 꼭 메구미네.”
“제가 그 후시구로 메구미니까요.”
조금도 놀라지 않은 얼굴로 열아홉의 고죠 사토루가 씩 웃었다. 천진하면서도 사나운 같은 미소였다. 후시구로는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여섯 살, 후시구로 메구미가 보았던 그는 언제나 짓궂게 웃고 있어도 어른 같았다.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열세 살이 많았다. 여섯 살과 열아홉 살의 간극은 깊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과 쌓아온 시간이 일 년 남짓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소년은 애정도 의심도 아닌 모호한 빛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우리 집 메구미랑 만나면 둘 중 하나가 죽거나, 그럴까?”
“그럴지도요.”
“우리 집 메구미가 널 보면 꽤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되겠네.”
그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성격이 나쁜 건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었다. 후시구로는 그의 표현을 입 안으로 곱씹었다. 우리 집 메구미라니, 함께 살지도 않았으면서 표현은 아주 가까웠다. 하긴 늘 이런 사람이었다. 제멋대로 거리감을 좁히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사람을 비집어 넣어두고 제 것이라 말하고는 했다. 그 울타리가 정말 그의 팔 안인지조차 알 수 없게 하는 사람이었으면서.
후시구로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거든요.”
“어디서 길을 잃었길래 여기까지 왔어?”
“고죠가 안에서요.”
“뭐라도 잘 못 펼쳤어? 아니면 잘못 디디거나 잘못 열었나?”
정확한 표현이었다. 후시구로는 제 요청에 오래된 비급과 주구, 봉인된 주물 등을 보관하는 비고祕庫의 출입을 허가해주며 고죠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츠미키의 저주에 관해서는 이미 내가 다 찾아봤어, 메구미.’
‘알아요, 그래도요.’
‘뭐…… 메구미가 정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들어가 봐도 상관은 없는데.’
‘없는데, 요?’
‘음…… 거기에 온갖 게 다 있어서, 잘못 펼치거나, 잘못 디디거나, 잘못 만지거나 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
‘큰일 나요?’
‘응.’
‘상관없잖아요.’
‘응?’
‘……당신이, 데리러 올 테니까요.’
제 말에 고죠는 드물게 파안대소를 터트렸다. 그는 그런 말도 할 줄 아냐는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는 말했다.
‘맞아, 내가 데리러 갈 거야.’
‘그럼 됐죠?’
‘응.’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딱히 그가 자신을 데리러 올 일 같은 건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에 신중히 확인하고 걷던 와중이었다. 이제 슬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벽을 짚어 조심스럽게 걷다가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정신 차려보니 눈에 익으면서도 낯선 장소에, 눈에 익으면서도 낯선 그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후시구로 메구미의 현 상황이었다. 자신을 데리러 올 사람은 있었으나, 언제 데리러 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후시구로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읊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저를 데리러 오길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실래요?”
“내가 왜?”
열아홉 고죠의 물음에 후시구로는 눈을 깜박였다. 그래, 그때는 그가 어른이라 생각했었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언제나 태산처럼 커다랬고, 언제나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맥락 없는 호의를 준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열다섯 후시구로 메구미가 마주한 것은 열아홉의 고죠 사토루였다. 여섯 살에 보았던 그와 같은, 그러나 조금 다른 감상을 남기는.
그래서 후시구로는 조금 건방진 미소를 그리며 속삭였다.
“지금, 재밌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신.”
“……음.”
“확인하고 싶잖아요, 당신이 구한 후시구로 메구미가, 어떻게 자라 있을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키워냈을지. 제 건방진 발언에 고죠는 눈살을 찌푸렸다. 한참 제 앞에 선 열다섯의 후시구로를 바라본 열아홉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난 우리 집 메구미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래요?”
“……그쪽의 나는, 언제쯤 널 데리러 오는데?”
후시구로는 저도 모르게 웃었다. 왜 웃어? 눈살을 찌푸린 채 묻는 소년에게 고개를 내저었다. 일부러 누가 데리러 오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당연히 스물여덟의 그가 자신을 데리러 오리라 말하고 있었다.
“몰라요.”
“뭐?”
“그러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사토루씨.”
그것이 길을 잃어 어느 시계 선에 불시착한 열다섯의 후시구로 메구미와 열아홉의 고죠 사토루의 만남이었다.